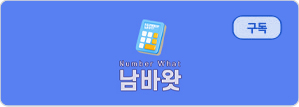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노트북 단상]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없다
- 가
권승혁 지역사회부 차장

‘죽어도 되는’ 노동자가 있다. 그것도 16번이나 죽임당했다. 이름은 미키 반스. 얼음행성 개척에 투입돼 온갖 위험한 임무를 도맡는다. 마루타처럼 생체 실험에도 동원된다. 얼음행성은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없는 죽음이 예정된 일터다. 미키가 믿을 건 죽고 나면 신체와 기억이 복제된다는 사실 뿐. 그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죽는 노동자다. 고통스러운 죽음이 반복되면 두려움마저 사라지는 건지…. 미키가 죽음의 고비마다 보여주는 체념 섞인 평정심(?)은 기이할 정도로 놀랍다. 비인간적인 공동체는 임무를 수행하는 미키가 살아있는지, 아니 ‘죽었는지’ 확인하지도 않는다. 그저 프린트하면 그만인 ‘익스펜더블,’ 인간 소모품이기 때문이다.
영화 ‘미키17’은 자연스레 한국사회에 만연한 산업재해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2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는 6명 노동자의 생명선이 타들어 간 대가로 휘황한 도시에 숨겨진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한순간에 들춰냈다. 10명의 인부가 숨지거나 다친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붕괴 사고는 충격 그 자체였다. 툭하면 어선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는 얼음 행성에 투입된 미키나 다름없다.
지난해 12월 ‘노동의 메카’를 자부하는 울산에선 20대 잠수 노동자가 차디찬 겨울 바다에 들어갔다가 주검이 돼 돌아왔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죽어간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그보다 2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열차에 치여 숨진 19살 하청 노동자 김 군을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린 걸까. 세 사건 모두 기본적인 2인 1조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참극이었다. 위험의 외주화에 희생당한 제2, 제3의 김용균은 시나브로 영화 속 열일곱 번째 미키를 넘어선 지 오래다.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죽음은 어쩌면 ‘죽임’에 가깝다. 고용노동부가 펴낸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593명에 달한다.
언제나 그랬듯 법의 처벌은 약하기 짝이 없다. 산재 다발 사업장 고려아연은 2021년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 4년 뒤 법원에서 원하청 책임자 모두 벌금 700만~10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2019년 9개월간 4명의 노동자가 숨진 HD현대중공업에선 사업부 대표 3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가 이마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대중의 관심이 시들대로 시든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이다. 이 또한 산재공화국을 떠받치는 숱한 사건 중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2022년 5월 에쓰오일 폭발 사고는 중대재해법을 빠져나간 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대기업들이 쾌재를 불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을 둔 울산에서조차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노동계의 자조 섞인 한숨이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노동 현장의 재해를 두려워하겠나.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는 대부분 온갖 통계에 묻혀 기억에서 멀어진다. 이러한 숫자들은 때로 우리를 현상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재해와 죽음에 둔감한 사회. 영화 미키17은 기실 인간의 존엄성이 죽어가는 현실을 겨냥하듯 반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