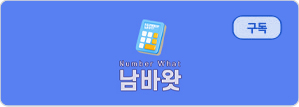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노트북 단상] 대선에 묻혀버린 기름 유출 사고
- 가
권승혁 지역사회부 차장

지난 4월 25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에쓰오일 송유관이 파손된 뒤 매일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흙을 새로 까는 작업이 한창이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대 공사라는 ‘샤힌 프로젝트’ 주변에서 케이블 매설 공사를 하던 중 그만 사달이 났다. 그날 4t의 원유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뒤덮고 1km 떨어진 바다로 흘러들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내년 4월까지 토양 정화 작업을 끝낼 참이다. 이만저만 품이 드는 게 아니나 사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렇다면 바다는? 기름띠 제거 같은 방제 작업을 완벽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사후 검증이나 실태 조사 등은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테트라포드 깊숙이 엉겨 붙은 검은 독이 시나브로 바다에 풀리는지 모를 일이다. 시민들의 관심은 대선에 쏠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분위기다. 올해로 서른 번째 ‘바다의 날(5월 31일)’이 유독 씁쓸하게 느껴진다.
온산공단의 토양과 연안을 기름 범벅으로 만든 이 사고는 해양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중의 중대재해’로 톺아봐야 한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만 중대재해가 아니다. 안 그래도 수십 년 산업단지를 껴안은 대가로 온갖 중금속에 오염된 바다가 급기야 기름세례에 몸살을 앓는다. 죽어가는 온산 바다를 한 번 더 짓밟는 꼴이다.
기름 유출은 자칫 바다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 먹이사슬의 기초인 플랑크톤을 죽게 하고, 물고기의 아가미를 틀어막는다. ‘자연의 콩팥’ 갯벌도 제 기능을 상실한다. 연안 생태계가 괴멸적 피해를 본다. 온산에는 갯벌도, 양식장도 없고, 기름띠도 서둘러 걷어냈으니 그저 괜찮다고 치부할 건가.
이 사고가 ‘땅속 화약고’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도 크게 우려스럽다. ‘공단에 무수히 깔린 지하배관은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상당한 의구심이 생긴다. 사고 지점에만 0.8~2.5m 아래에 송유관과 화학, 가스 등 20여 가지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굴착 과정에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GIS)으로 배관 위치를 미리 파악하게 돼 있다. 매설물 관리기관 등의 현장 감독도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지름 42인치 송유관에 천공을 내는 대형 사고가 났다. 원칙을 어겼거나, 감독에 소홀했거나, 매설 정보에 문제가 있었거나, 크고 작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이건 지하매설물 관리체계에 구멍이 난 것으로 봐야 한다.
관계기관 대응 체계도 허울만 요란하다. 노후 지하배관을 지상에 재설치하는 통합파이프렉 구축 사업은 법 기준을 맞추지 못해 10여 년째 하세월이다. 국가산단 지하배관을 관리하는 통합안전관리센터도 올해 5월 준공해 이제 걸음마 단계다. 배관 종류에 따라 관리부처도 제각각이다. 이대로라면 울산 국가산단에 깔린 1800여km 지하배관이 모두 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도시 전반의 안전을 성찰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불행 중 다행이라 여기면 답이 없다.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시간이 늘 우리 편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도시의 명운이 달린 산단 안전이 무슨 복권도 아니고 언제까지 행운에 기대야 하나.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