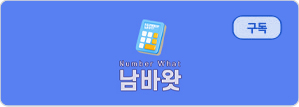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허동윤의 비욘드 아크] 봄, 돌봄, 공동체 그리고 건축
- 가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대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8살 초등생이 살해당했다. 피의자는 같은 학교 교사다. 가장 늦게 혼자 하교하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워킹맘들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 된 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왕따, 집단 폭력 외에도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다.
“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울증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마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특정 집단의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위험하다. 오히려 교육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모두 일을 하는 경우 아이들 돌봄은 가장 힘들고 또 중요한 문제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방과 후 여러 학원에 다니게 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저출생 문제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돌봄이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비극
지역과 연계한 학교 역할 고민 던져
아동·노인 돌봄 등 다양한 용도 가능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 검토할 시점
대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 체계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이를 위한 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시설과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공동체적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가 있으면 그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의 양육 과정에 자연스럽게 함께 참여하곤 했다. 하굣길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묻고 집에 데려와 밥을 먹이기도 했다.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이면 마을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아이가 방과 후 집에 오지 않아 학교에 찾아가면 십중팔구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자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했다.
여전히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인구 소멸, 저출생과 함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하교 후 방치되는 넓은 공간을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면 교육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도 구축할 수 있다.
일본 사이타마현 요시카와시의 미나미소학교는 지역의 공공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주민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육아지원센터, 어린이 보육시설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복합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는 동선 분리와 운영 시간 조정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1층 동쪽에, 학생들의 특별 교실은 서쪽에 배치해 동선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시설별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학교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주민센터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등으로 운영된다. 프랑스의 에코 스쿨(Eco-School) 모델은 학교를 지역 친환경 커뮤니티 센터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식이며, 핀란드에서는 민간단체인 ‘만네르하임’이라는 아동복지연맹과 학교가 협력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돌봄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노인들은 가족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활했지만, 현재 노년층은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면서도,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일본의 코다마 프로젝트는 시니어와 아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시니어에게는 돌봄 교사의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서도 ‘돌봄’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학령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평생교육을 확장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학교 시설은 학교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이자 가장 안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우선하여 고려돼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대전 초등학생의 비극적인 사건에서 피의자는 가장 늦게 하교하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 대상은 특정한 아이가 아니라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공공의 눈이 있었다면 함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제는 돌봄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동체의 역할을 확장할 때다.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 튼다는 우수(雨水)가 지났는데도 한파는 여전하다.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로 마음까지 추운 시절, 돌봄이 우리 사회에 봄기운을 몰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