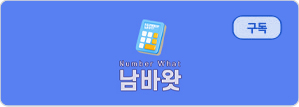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기고] 이젠 소화기를 넘어…
- 가
김성현 동의과학대 응급구조과 교수

과거 1990년대 반상회가 있었던 시절부터 최근까지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비롯하여 명절 귀성길 ‘고향 부모님 댁에 소화기 드리기’ 등 주택 화재 초기 진화에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전 국민 소화기 비치 운동으로, 주택 뿐 아니라 모든 화재의 영역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마침내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열매를 맺어서 법적 지위까지 인정받았고. 2022년도에 법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주택(아파트 제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지 및 소화기)의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대형마트의 한 코너에서는 판매 부스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우리 생활 사이에 자리 잡았다고 본다면 눈을 조금 들어 주택 외 아파트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 국민의 2명 중 1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2024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를 통한 전국의 아파트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총 3193건에 28명이 사망하고 33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08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대피 방법의 경우 2023년 12월 25일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이후 라디오의 재난 방송이나 소방청의 홈페이지에도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무조건 피난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피난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하거나 집안에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꼭 막아야 한다.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행정 업무로 32년의 세월을 보내고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파트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소방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아파트 소방교육에 나가보면 낮 시간대라 그런지 주로 어르신들과 경비원 몇 분들만 참여하고 실제 화재진압훈련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교육의 효과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화재 시 옥내소화전을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사용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아파트에는 소화기는 물론, 옥내소화전이라는 훌륭한 소방시설이 있다. 불이 나서 연기가 나오는 순간에도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직접 진화하기보다 소방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옥내소화전은 소방관들만 사용하는 소방시설이 아니다. 소화기보다 진화 능력이 뛰어난 옥내소화전을 바로 옆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바로 옆에 있는 구명부환을 던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관창(노즐 nozzle)에 관한 부분이다. 관창에 관한 사용 설명은 옥내소화전 사용 설명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요즘 옥내소화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관창은 개폐가 가능한 관창이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함을 열고, 호스를 편 후 밸브를 열어 물을 뿌린다고 가정했을 때 관창이 열려 있을 때와 잠겨 있을 때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수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혼자 호스를 펴고 물을 개방했을 때 관창이 열려 있다면 그 호스는 소위 ‘뱀춤’을 추게 된다. 이리저리 날뛰는 호스를 잡기도 쉽지 않다. 이렇듯 옥내소화전을 사용할 땐 반드시 관창을 왼쪽으로 돌려 잠근 상태에서 밸브를 열어야 한다. 관창을 잡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수압에 따른 흔들림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만약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 초기 진화의 파수꾼 소화기를 넘어 이젠 옥내소화전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힘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