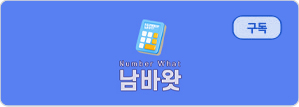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기고] 싱크홀 언제 또 발생할까 우려된다
- 가
추태호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추태호, 부산대 명예교수. 부산일보DB
추태호, 부산대 명예교수. 부산일보DB
지난 4월 13일 새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도심 한복판에서 깊이 4.5m의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2024년 8월의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지반 침하 붕괴로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이어, 같은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벌써 두 번째다. 시민은 불안에 떨고, 부산교통공사는 복구에 나섰고, 언론은 ‘또’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재난이었다는 점이다.
부산은 단순한 연약지반 도시가 아니다. 매립지, 하천 충적지, 해수면 영향권, 지하터널, 지하철 공사, 심부 지하주차장 건설이 한 도시에 동시다발로 존재하는, 말 그대로 복합지반도시다. 이러한 도시에서 더 깊이, 더 넓게 땅을 파는 개발이 매일 벌어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시공하고 감시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지반침하의 원인은 이미 명확하다.
집중 호우에서 지하수 유입, 차수 공법 미비, 토류판 유실, 공동 형성, 세굴 발생, 구조물 붕괴 순으로. 이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리동역학적 연쇄 반응이다. 이제는 ‘강우’나 ‘노후측구’ 같은 단일 원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흐름, 지반 내부의 간극수압, 수압차에 따른 구조 응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과학적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실시간 수리동역학 기반 통합감시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는 단순한 계측기 설치가 아니다. 지하수위계, 변위계, GPR탐사, IoT통신망, 그리고 FEFLOW·PLAXIS와 같은 지하수-지반 상호작용 모델링 프로그램을 연계해, 단일 구간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지반을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감지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제 지반 보강에 있어 친환경성과 구조적 안전성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무기계 재료 등은 수밀성과 내구성이 탁월할 뿐 아니라, 지하수 추가 오염 방지, 침투수 유입 차단, 세굴 저항성 강화,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지반침하 방지용 핵심 재료가 될 수 있다. “이 공사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안전재료가 사용됩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그런 설명이 가능한 도시공사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험지도를 공개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계획에 지반 안전 해석 보고서와 실시간 감시 계획을 필수 첨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부산은 땅이 꺼지는 것을 ‘복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안전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사를 외치고, 전문가들은 더 과학적인 시스템과 친환경 재료의 도입을 요구한다. 도시의 안전은 우연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제도로 지켜지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부산은 ‘깊게 파기 전에 깊이 예측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 부디 지난 4월 사고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