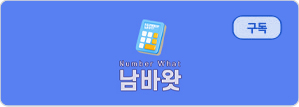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편집국에서] 너와 나의 거리
- 가
관계의 상징, 사람 사이 거리
역사·문화 따라 장단점 명확
코로나19·정치 양극화 상황
심리·물리적 관계 더 멀게 해
정치 혐오, 대화 단절 극복해
‘온오프 공동체’ 공존 모색해야

1990년대 중반,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발견한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였다. 말 그대로 ‘나’에게 타인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느냐에 관한 것이다. 살면서 그 거리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미국의 어느 카페나 가게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설 때, 어느 순간 뒤에 선 사람이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형마트에서도 카트를 부딪거나, 어깨를 툭 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실수로 접촉이 발생하면 꼭 미안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의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상황이 생겼을 때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 매너를 지켰다. 그런 행동들이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 주었다. ‘역시 사는 곳이 넓으니 삶의 여유도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때때로 나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줄을 선 사람이 내뿜는 숨을 고스란히 느낄 지경이었다. 거기서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면 듣고 싶지 않은 개인사가 어지러이 귀에 들어와 박히는 걸 막을 도리가 없었다. 정중하게 “조금만 떨어져 달라”고 말해도 ‘왜 그러냐’는 표정이 돌아왔다.
서양 문화에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의 마지노선은 1.2m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공간’을 지켜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관계 유지는 나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무엇보다 개인의 독립성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한다.
이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두 문화에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됐다. 상호 의존적이고 연고주의와 공동체 문화가 강한 대한민국에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분명 당황스럽게 가깝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적인 정이 존재했다. 누군가의 가족을 가까이에서 지켜주려는 DNA가 몸속에 흘렀다. 나이 지긋한 택시 기사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가슴이 훈훈했던 적도 많았다. 거리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면 누구랄 것 없이 달려와 도와주는 모습이 그 증거다.
네트워킹을 그저 비즈니스 수단이라 여기는 외국인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정이 많은 공동체를 가진 K문화를 칭송하는 시대가 됐다. 공동 경제 커뮤니티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팍팍한 삶을 헤쳐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 덕이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낯선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알고리즘과 SNS, AI라는 말이 상황을 급속히 악화시킨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거리두기’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휩쓸고 지나간 뒤에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서로를 밀어내는 자석의 양극처럼 멀어졌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3월을 지나는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잔인한 시간을 견디고 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조심스러워서 정치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 SNS에서는 정치적인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닫는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버렸다. 정치적 양극화가 선을 넘어선 탓이다.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오롯이 우리의 미래다.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어떤 정책이 좋은지 이야기하고, 이를 정치인들이 수렴해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 사회다. 정치 문화 선진국에서는 견해가 다르다고 인간 관계까지 단절하는 경우가 드물다.
알고리즘의 미로에 갇혀 혐오만 하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보인다. 그런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일상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생각과 언행은 비판 받고 배척되어야 하나, 생각이 다르다고 단절을 택할 이유는 없다. 서양식 문화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꽤나 난처한 존재로 여길 테다. 개인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가 강해지는 현실에서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너와 나의 거리를 무조건 좁혀야 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그렇다고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 만든 가치를 애써 부정할 이유 역시 없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고된 삶을 견뎌온 그 DNA는 분명한 우리의 강점이다. 미국식 개인 존중이 가진 장점을 취하되, 공동체 정신을 온오프라인에서 균형감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이다. 그런 사회가 미래를 담보한다. 디지털 알고리즘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DNA를 품은 아들딸을 길러내는 것 역시 우리의 의무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같이 안 속상해야 더 좋아서’ 누군가를 도왔다는 주인공의 말처럼, 이해하며 공존하는 대한민국이 힘의 근원이다.
박세익 디지털영상센터장 run@busan.com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