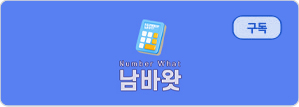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편집국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단상
- 가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대통령’
유권자들 남의 일 치부, 관심 떨어져
정치적 중립에도 진영 대결 전락
단일화에만 목매는 선거전 지양
언론, 날카로운 검증의 칼 들이대야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부산은 외지인들이 보기엔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곳이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공기관이나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부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부산에 혼자 산다는 점이다. 아이들을 비롯한 배우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만 부산에 내려와 있다. 물론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부산으로 데리고 오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웬만해선 서울에 두고 온다.
아이들을 키우기엔 사교육뿐만 아니라 부산의 공교육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비단 외지인들의 경우만 그런 것은 아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지 의구심이 든다. 단순히 ‘인 서울’ 명문대 입학생 수만을 따지는 게 아니다. 학력 신장만이 아니라 특기교육이나 인성교육 등 특색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냥저냥 시간만 보내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자리다. 각 시도의 막대한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책임진다. 부산의 경우 연간 5조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된다. 올해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은 5조 3351억 원에 달할 정도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자치 및 전문성 강화 등의 요구로 2006년 직선제가 도입됐다. 그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투표하는 식의 여러 가지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대표성이 떨어지고 조직선거나 금권선거 등의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변화를 겪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교육감 후보 추천은 금지됐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2007년 2월 첫 직선제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부산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 등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버린 50대 이상의 유권자, 아이가 없는 미혼의 유권자들에게는 마치 남의 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초기의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로 희화화되기도 했다. 후보가 난립하면서 공약이나 인물보다는 투표용지 기재 순서가 당선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1번 혹은 2번 등 앞번호를 뽑은 후보가 전국적으로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번호 추첨만 잘하면 당선되는 로또 선거로 전락한 것.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후 진영 간 단일화 바람이 불었다. 난립하던 후보는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라는 진영 깃발로 모이면서 이념 대결로 치달았다.
로또 선거는 사라졌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교육감 후보 추천 금지라는 정당공천 배제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뉜 교육감 후보자들은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입고 다니거나 선거 현수막과 포스터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도 예외 없다. 정책이나 인물 대결이 아니라 사실상 이념 대결로 굳어지고 있다. 정책이나 인물 검증은 뒷전이고 진영 간 단일화에 목매달고 있다.
지난 15일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이번 선거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보수 단일화 결과는 오는 23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정책 검증이나 인물 검증의 기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정책 홍보보다는 단일화에만 목맨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를 정치인들의 선거와 다를 바가 없는 이념·진영 대결로 만든 책임이 있다.
2022년 6월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49.1%였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감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겨우 23.48%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도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념 대결로 치닫는 교육감 선거가 진영 간 조직 대결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매치업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과 인물 검증에 소홀히 했던 언론도 남은 기간 분발해야 한다. 날카로운 검증의 칼을 들이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시민적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문제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선거로 보면 안 된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만, 부산의 교육이 살아날 수 있고 부산의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다.
최세헌 편집국 부국장 cornie@busan.com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