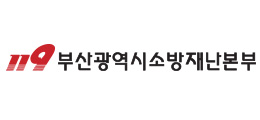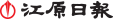[데스크 칼럼] '서울내기 다마내기'의 추억
- 가
박종호 스포츠라이프부 선임기자
'고백의 역사' 부산 사투리 감칠맛 인기
현실에선 서울말 써야 대접 받는 세상
예쁘고 좋은 지역 언어 계속 사용하게
'시민의 날', 부산말 쓰는 날로 만들어야

‘고백의 역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광안대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98년 부산을 배경으로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되살리게 해 주는 영화다. 넷플릭스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톱10 비영어 영화 부문 3위에 올랐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부산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두근거렸을 테니 반가운 일이었다. 다소 유치하게 느낄 수도 있었던 스토리를 맛깔나게 만들어준 일등 공신은 바로 부산 사투리였다.
부산 출신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이 영화에서 부산말은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상 표준어였다. 주인공 박세리 역할을 맡은 서울 출신 배우 신은수의 부산 사투리 연기도 부산 사람이 볼 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꽤 괜찮았다. 특유의 발랄함과 풋풋함이 사투리 연기와 어우러져 더욱 매력적인 캐릭터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 부산말을 어떻게 그 정도로 찰지게 구사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신은수 배우는 촬영 수개월 전부터 부산 사투리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높낮이와 억양 등을 상세히 적어둔 대본을 통째로 외워버렸다고 했다. 그는 “부산말은 규칙이 있는 듯 없고, 단어마다 높낮이가 은근히 디테일하다”라고 말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부산 사람은 의식도 못 하고 쓰는 것까지 알아차린 셈이다. 또 “한 끗 차이인데 언어를 새로 배우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듣기에는 똑같은데 선생님은 틀렸다고 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캐치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부산말 배우느라 억수로 고생했던 모양이다. 오죽하면 앞선 영화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그가 했던 수어 연기보다 부산말이 더 어려웠단다. “참말로 욕봤다”는 말로 칭찬해 주고 싶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부산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우리 부산 사람들은 자부심을 쫌 가져도 되지 않을까.
‘서울내기 다마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랩송 같이 들리는 이 말놀이를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1950~1970년대에 아이들이 서울말을 쓰는 아이를 놀릴 때 의미도 모르면서 쓰던 표현이었다. 전학생이 서울말을 쓰면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되레 부산에서도 서울말을 써야 대접받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얼마 전 지인은 아내로부터 ‘귀가 후 소파에 누워 뒹굴뒹굴하지 말 것’과 ‘집안에서 사투리 쓰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평소 그의 언행을 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집안에서 묵언수행을 하란 말인지…. 취재차 만난 임영아 작가에게 들은 이야기도 충격적이었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닐 때 교수가 “PPT를 하는데 왜 사투리가 튀어나오냐”라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부산 사람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써야 하고,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인지.
세상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도 있다. 최근 〈쓰잘데기 있는 사전:말끝마다 웃고 정드는 101가지 부산 사투리〉를 출간한 전주 출신 부경대 양민호 교수와 서울 출신 최민경 교수가 그런 사람 같다. 이들은 부산에 살면서 대체 불가능한 부산말이 있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통증을 표현하는 ‘우리하다’, 뜻을 모르는 부산 사람이 없는 ‘속닥하다’는 표준어로 그 뉘앙스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바보축구온달’은 세 단어 모두 표준어로 이뤄졌지만 합치면 사투리가 된다니 헛웃음이 나온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부산 사투리에는 부산의 시간과 정서, 생존과 유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정작 부산 사람들은 이렇게 재밌고 멋진 부산말을 제대로 자랑하지 않는 듯하다”라고 일갈했다. 예쁘고 좋은 부산말을 살려서 잘 사용하면 좋겠다는 이들의 주장에 크게 공감하게 된다.
일본에는 사투리 사전이나 사투리를 쓴 손수건 등을 굿즈로 판매하지만, 부산에는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부산팬들은 ‘아주라’와 ‘마!’ 같은 함축적인 말을 유행어로 만들었는데, 왜 그런 상품도 하나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부산말만큼 부산을 잘 드러내는 게 또 있을까.
10월 5일 ‘부산시민의 날’이 다가온다. 이날을 부산말을 쓰는 날로 만들면 좋겠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은 부산말로 연설하고, 지역방송 앵커들도 인사말 정도는 부산말로 시작하는 것이다. 〈부산일보〉를 비롯한 지역신문도 기사나 제목에서 부산말로 멋을 줘도 좋겠다. 학교에서도 부산말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다. 가을 야구의 시즌이 돌아오니 최동원 선수가 생각난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마 함 해 보입시더”라고 하지 않았을까.
박종호 기자 nleader@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