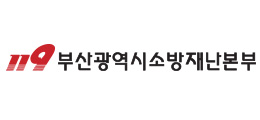[강소상인 비밀노트] 부산대 앞 '명물토스트' 최순득 사장
- 가
"1천500원짜리 물건 팔지만 서비스는 백화점급으로 드려요"
 부산대 앞 '명물토스트' 최순득 사장은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이다. 삼단토스트에는 야채와 계란이 기본에 종류별로 햄, 치즈, 참치, 베이컨, 떡갈비가 들어간다. 강원태 기자 wkang@
부산대 앞 '명물토스트' 최순득 사장은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이다. 삼단토스트에는 야채와 계란이 기본에 종류별로 햄, 치즈, 참치, 베이컨, 떡갈비가 들어간다. 강원태 기자 wkang@순간 알던 사람인가 하고 당황했다. 부산대 앞 '명물토스트'를 찾아간 날, 취재 전에 가게를 한 번 지켜보자 싶어 행인처럼 그냥 스쳐 걸어가는데 토스트를 굽던 최순득(53·여) 사장이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아침저녁으로 오는 한 단골 학생은 밤늦게 와서 그러더란다. "이모, 아침에도 웃더니 아직도 웃고 있네요."
'명물토스트'는 부산대 정문을 나서자마자 보이는 삼단토스트 노점이다. 1천500원이면 야채와 계란, 햄 또는 치즈를 쌓은 두툼한 삼단토스트가, 또 1천500원이면 과일을 갈아 넣은 생과일주스가 해결된다. 부산대 앞 삼단토스트는 이곳 외에도 많지만, 이곳만큼 유명하고 또 많이 파는 가게는 없다. 일 년 중 가장 붐비는 신학기에는 토스트만 해도 하루 700개는 거뜬히 넘게 팔려나간다.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온다. TV 방송과 블로그 입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갈수록 늘고 있다.
신학기 하루 토스트 판매 700개 불티
특제소스에 '바딸'생과일주스 개발
친절·최고의 맛·간절함이 성공 비결
'명물토스트'가 부산대 앞 삼단토스트의 원조는 아니지만 처음 시도한 것들은 많다. '명물토스트' 전에는 부산대 앞에 상호가 있는 토스트 가게가 없었다. 야채를 소스에 버무려서 얹는 게 아니라 생야채 위에 소스를 뿌린 것도, 달콤하면서도 강렬한 맛의 검은색 특제 소스를 개발한 것도 명물토스트가 처음이었다. 토스트 전용 삼각 케이스를 만든 것도, 생과일을 앞에 진열해두고 즉석에서 갈아주는 것도 이 집이 처음 시도했다. 바나나와 딸기를 섞은 최고 대박 상품 '바딸' 생과일주스는 최 사장만의 발명품이다. '바딸'은 서울 토스트 가게들까지 다 따라서 도입했다고 했다.
세 명 직원이 서면 꽉 차는 기역 자 모양의 점포에서는 최 사장과 '이모님'들이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밤 1시까지 앉을 짬도 없이 계란을 부치고 과일을 간다. 회전율이 빠르니 재료는 신선할 수밖에 없다. 계란이나 햄 따위 재료는 하루 두 번 입고 되고, 여름에는 토스트보다 더 인기가 많은 생과일주스의 과일은 최 사장의 남편이 매일 반여농산물시장에 가서 사온다. 상인들이 '이렇게 싱싱한 과일로 주스를 만드냐'고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은 과일을 쓴다. 바나나는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최고급 품질인 스위티오 바나나를 산다.
2005년 7월, 원래 토스트 가게를 하던 점포를 인수해 장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금만큼 붐볐던 건 아니었다. 맛 이전에 최 사장이 집중한 건 친절이었다.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한테도 천오백 원 하는 토스트를 팔더라도 백화점 수준의 최고의 서비스를 주자고 늘 말해요. 기쁜 마음으로 목소리 톤을 높여서 인사하고, 토스트를 줄 때에는 꼭 손님 눈을 마주보면서 주라고 강조하고요."
그렇게 최 사장은 수백 명 학생들의 '이모'가 됐다. '내 아들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든 토스트를 먹고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취직한 뒤에도 몇 년이고 최 사장을 찾아온다. 아르바이트나 창업으로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장사 노하우를 알려 달라"고 많이 찾아온다. 그의 조언은 이렇다. '무조건 개업 초기에 최고의 맛을 보여줘라.'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집이 생기면 일단 한 번 가본다. 그 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님에게 눈을 떼지 마라.' 손님이 뭘 원하는지 늘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라.'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최 사장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동래에서 작은 튀김 분식집을 하다가 2005년 부산대 앞으로 첫 진출했을 때 자리는 지금 자리 맞은편 아주 작은 가게였다. 남편이 택시를 몰면서 아픈 부모님과 대학생과 고 3 두 아들을 키울 때였는데, 장사는 영 시원찮았다. "그 때 늘 맞은편 이 가게를 보면서 저기라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매일 꿈을 꿨어요." 그 꿈은 2개월 만에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엄두가 안 나던 계약금도 친구의 도움으로 거짓말처럼 해결됐다. 그가 "간절하게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유다.
프랜차이즈를 하자는 제안도 많지만 최 사장은 계속 거절하고 있다. 대신에 "언제든 와서 보고 배워 가시라"고 말한다. "하루에 수백 명 학생들이 다녀가는 우리 가게가 제게는 기적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육십까지는 계속해서 토스트를 굽고 싶어요."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