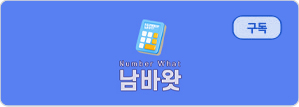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노트북 단상]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영화 ‘밀양’의 메시지
- 가
김형 편집부 차장

최근 재주목 받고 있는 영화 ‘밀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
자식을 잃은 신애가 교도소에 있는 아들의 유괴범을 찾아간다. 그녀는 절망 끝에서 용서라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자 한다. 그 순간, 유괴범은 담담하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녀는 이 한마디에 다시 한 번 무너진다. 도대체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영화 속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메타포라 볼 수 있다. 직장 내 폭행이나 갑질,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 대다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직에 남고, 정작 피해자에겐 트라우마와 악몽이 삶의 일부가 되는 현실을 선명히 보여준다. 피해자는 무너진 자존감과 정체성,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견디는데 말이다.
통계는 이 비극을 수치로 입증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반면 가해자의 약 90%는 그대로 조직에 남는다. 일부는 30년 넘게 재직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 비정상적인 풍경이 너무나도 익숙한 게 한국 사회 문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 중심에는 가해자 중심의 조직 구조가 단단히 놓여 있다.
심리학자들은 가해자의 자기 합리화 기제를 지적한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는 “순간의 실수였다”, “내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다.” “그땐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그 사람도 날 자극했잖아” 식의 자기 구원 서사를 만든다. 영화 ‘밀양’ 속 유괴범 역시 그렇다. 그의 “신께 용서 받았다”는 말은 피해자를 향한 사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자기중심적 언어였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한국 사회는 갈등을 회피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집단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공감보다 회피, 진실보다 침묵, 책임보다 체면이 우선 시 된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분위기를 흐린다”, “그만 좀 해라”,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같은 말로 ‘용서’를 강요한다.
특히 “술에 취해 그랬다”, “몇 대 맞은 걸로 오버하냐?”라는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쓰인다. 한국 문화가 이렇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하는 이들도 많다. 방관자들로 인해 그동안 ‘가족’, ‘선배’, ‘동료’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폭력과 폭언이 용인돼 왔는지 우리는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사회가 여전히 형벌 중심의 구조인 점도 가해자에게 ‘가짜 반성’의 기회를 준다. 징계나 사과가 이뤄지면 사건은 끝났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은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사과와 징계 후에도 피해자는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조직 생산성에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WHO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실은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 영화 ‘밀양’은 일상이라 여기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직시한다. 진짜 잘못한 가해자가 고통을 안고 반성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사회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