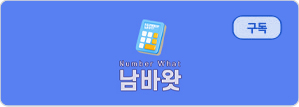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김필남의 영화세상] 왜 우리는, 우리에게 총을 겨누어야 할까?
- 가
영화평론가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
미국 내전 속 극한상황 배경
'민주주의 퇴행' 카메라에 담아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 스틸. 마인드마크 제공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 스틸. 마인드마크 제공
분열의 시대다. 좌우만 남았다. 두 개로 쪼개진 세계를 지배하는 건 폭력이다. 폭력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폐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 세계에 ‘사람’은 없다. 미국에 내전이 일어났다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빌 워: 분열의 시대’를 허구라고 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세계는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신념이나 이념의 차이로 불거진 갈등 앞에서 누구 하나 물러설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영화는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연방정부에 반발해, 미국의 19개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하며 최악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영화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를 주축으로 한 막강한 전투력을 지닌 서부군과 힘을 잃은 연방정부군의 격렬한 대립에 초점을 둔다. 오프닝은 긴장한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연설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미국 시민 ‘모두’에게 말하지 않는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은 적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미국의 시민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도시는 이미 무장한 군인들과 탱크에 점령당했지만, 대통령은 마치 그런 현실을 보지 못하는 듯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창밖으로 폭격을 맞은 건물이 화염에 휩싸여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영화에서는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통령 편에 선 정부군과 대립하는 반정부군, 살기 위해 물을 달라고 소리치는 시민들의 혼란한 상황만을 조명한다. 이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어떠한 감정도 없이 바라보는 종군기자들이 등장한다. 베테랑 사진기자 ‘리’와 취재기자 ‘조엘’, 은퇴를 고려하는 노년의 기자 ‘새미’는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으로 향한다. 그리고 ‘리’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신입 ‘제시’까지 합류하며 1379㎞의 여정이 시작된다.
로드무비의 형식을 띠고 있는 영화는 기자의 시선으로 디스토피아 미국을 그린다. 길거리에는 주검들이 넘쳐나고,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혼란한 가운데 리는 냉철히 상황을 판단하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찍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사명이라도 되는 듯 행동한다. 리는 기자의 역할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영화는 의도적으로 기자들이 보다 좋은 컷을 위해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찍’는 것처럼, 군인 또한 정의를 위해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반대되는 쪽을 무차별적으로 ‘쏘’는 것임을 알린다.
이는 앨릭스 갈런드 감독의 의도이다. 어떤 가치관을 내세우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열의 시대를 보여준다. 그로 인해 영화에서는 전쟁영화의 스펙터클함은 찾아볼 수 없다. 군인이 총을 쏘아 누구를 맞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잔인한 순간을 전달하려 애쓴다. 특히 대통령을 찾아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이르면 실제 전쟁터에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영화를 보는 내내 무엇을 위해 왜 우리는, 우리에게 총을 겨누어야 하는 것인지, 국가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무능력한 국가에 분노하고,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무엇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진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국민들이 겪은 공포와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수없는 갈등과 균열을 생각한다면 영화 속 현실을 허구라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는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퇴행한다. 증오와 분노는 더욱 심화한다. 정치적 분열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 그리는 ‘시빌워: 분열의 시대’는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는 기자의 눈을 따르지만, 영화를 본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없다. 분열의 시대에 고통받는 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