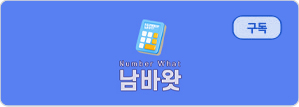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김필남의 영화세상] 내가 '나'라는 괴물을 낳는다
- 가
영화평론가
코랄리 파르쟈 감독 '서브스턴스'
중년배우 엘리자베스의 욕망 담아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 고민 던져
 영화 '서브스턴스' 스틸컷. 배급사 NEW 제공
영화 '서브스턴스' 스틸컷. 배급사 NEW 제공
더 근사하고 완벽한 나를 꿈꾸는 건 누구의 욕망일까?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극단적으로 나를 훼손하는 주인공이 여기 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파국으로 향하는 종착지임을 알지만 멈출 수 없다. 이미 맛본 과즙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이다. 코랄리 파르쟈 감독의 ‘서브스턴스’는 욕망이 나를 잠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잔인하게 일깨우는 영화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였던 ‘엘리자베스’(데미 무어)는 현재 TV 에어로빅 쇼 진행자로 카메라 앞에 서고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과거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다. 게다가 50번째 생일을 맞이한 그녀는 에어로빅 진행마저 그만둬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 프로듀서가 나이 든 엘리자베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어리고 섹시한’ 여성을 찾는 데 혈안이기 때문이다.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자베스는 자기 얼굴이 걸려 있던 도로 간판이 철거되는 모습을 넋 놓고 보다 교통사고까지 당한다. 자동차가 박살 날 정도의 큰 사고였지만 거짓말같이 한 군데도 다치지 않은 엘리자베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병원을 나선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든 정체 모를 USB를 발견한다.
7일 동안 젊은 몸을 얻을 수 있는 약물 서브스턴스의 정보를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주저하지 않는다. 젊음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듯 약물을 투입한다. 영화는 약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마치 허무맹랑한 설정이 영화를 지탱하는 동력이라도 되는 듯 무섭게 몰아칠 뿐이다. 그때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새로운 자아, 아름답고 젊은 ‘수’(마가렛 퀄리)가 태어난다. 영화는 처음부터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탄생한 수가 엘리자베스와 같은 인물임을 잊지 말라고 주지시킨다.
수는 엘리자베스가 갖고 싶은 젊음이며 못다 이룬 청춘이다. 그런데 ‘나’의 욕망을 반영해, 또 다른 자아를 얻었음에도, 엘리자베스는 이전보다 더 큰 상실감을 느낀다. 7일은 엘리자베스, 7일은 수로 살아간다는 서브스턴스의 규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일주일 동안 젊고 매력적인 수가 이룩한 것들을 확인할 때면 엘리자베스는 비참해질 뿐이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수가 자신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질투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엘리자베스의 상실감을 거울을 보는 장면을 통해 전달한다. 탄력 잃은 엉덩이와 뱃살을 바라보며 그녀가 제 몸을 혐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만든다. 그런데 그녀가 비참한 이유는 나이듦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음만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나이 든 자신이 문제적 인간이 된다. 이유 없이 해고당해도 그저 받아들여야 하며, 더 이상 상품이 되지 못하는 몸은 불신의 이유가 된다. 젊음을 되찾은 ‘수’가 자신을 모욕한 방송국으로 다시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사실 엘리자베스의 몸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뿐이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브스턴스’는 이상한 영화다. 비논리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점점 그 상황에 수긍하게 된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토록 집착하던 아름다움이 비단 그녀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요, 여성의 외모를 소모품처럼 소비하는 미디어,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허상이 엘리자베스와 수를 ‘괴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영화의 엔딩에 가까워질수록 끔찍함의 강도가 높아진다. 괴물이 되어버린 ‘엘리자베스’는 악몽으로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악몽은 잔인하면서도 슬프다. 영화의 장르가 왜 바디 호러물인지 납득이 간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