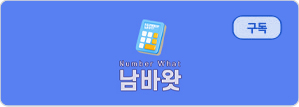[데스크 칼럼] 미지의 부산
- 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 지역 진입한 부산
민선 8기 성과 강조에도 청년 유출은 전국 최고
지방소멸-글로벌 허브도시 간극 좁히는 시정을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미지는 두손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젊은 여성이다. 혼자된 엄마 옆에서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간병하고 딸기밭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려고 경력 한 줄 없는 텅빈 이력서를 낸다. 그러다 모종의 사정으로 서울에서 공사를 다니는 쌍둥이 미래와 당분간 인생을 바꾸기로 한다.
드라마에서 서울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상처로 돌려주고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무릎을 꺾게 만드는 차가운 도시다.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만나는 낭만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반면 두손리는 이웃간의 정이 남아있는 시골 마을이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익숙한 가족과 돌봄 부담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고향으로 묘사된다.
가상의 마을 두손리는 유추해보자면 십중팔구 소멸위험 지역일 것이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 단계로 분류한다. 지난해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부산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서 충격을 안긴 바로 그 지수다.
부산은 서울 다음 가는 대도시라고 하지만 청년 인구 유출과 급격한 고령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두손리와 더 비슷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봐도 부산은 16개 구·군 가운데 11개가 소멸위험 지역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을 보면 소멸위험도가 높을수록 인구 유출도 많은데,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0.4 미만인 광역시 구에서는 10년간 20~39세 인구 순이동률이 24.6%나 감소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난 도시는 활력을 잃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전후한 주간을 경제 행보로 채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대우제약 공장 증설 업무협약에서 시작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발굴하는 ‘청끌기업’ 발대식으로 끝나는 주간 일정에서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시정 성과와 지향성을 부각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시장이 최근 전 부서에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임기 동안 여러 유의미한 성과를 냈는데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영향력이 미미한 레거시미디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에 그치지 말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나왔다.
시정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는 물론 중요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홍보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억울함도 일견 이해가 된다. 단적으로 재선 이후 부산시가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11조 원을 돌파했고, 취임 이전과 비교하면 부산의 투자 유치가 2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을 접하면 부산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문제는 간극이다. 11조 원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청년들은 부산에서 일도 사랑도 찾기 힘들다. 지난해 2분기 부산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같은 연령대 인구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크게 줄었다는 뉴스도 있었다. 2023년 부산 청년(18~39세) 통계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 혼인율도 40% 가까이 떨어졌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부산시장에 취임한 지 4년 남짓, 주력 과제의 진전에도 아쉬움이 있다. 재선 임기 전반부를 올인한 2030월드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돌아갔고, 다음 도시 비전으로 작심하고 추진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못 넘더니 예상 밖의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동력을 잃었다. 조기 대선으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더 난망한 상황이 됐다.
‘지방소멸’과 ‘글로벌 허브도시’ 사이. 민선 8기 남은 임기 1년의 성패는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시장이 늘 강조한다는 ‘행정은 축적’이라는 말대로, 지난 4년간 시정의 방향성이 맞고 진정성이 충분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수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중단된 과제들도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필요하면 설득해서 부산에 도움이 되도록 되살려야 한다.
‘미지의 서울’은 이제 2회만 남겨두고 있다. 미지와 미래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장소에 남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쓸모를 고민하는 미지에게 남자 주인공이 해준 “네가 있는 곳이 네 자리”라는 대사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건 알겠다. 부산에 살고 싶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미지들을 위한 시정을 기대한다.
최혜규 사회부 차장 iwill@busan.com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